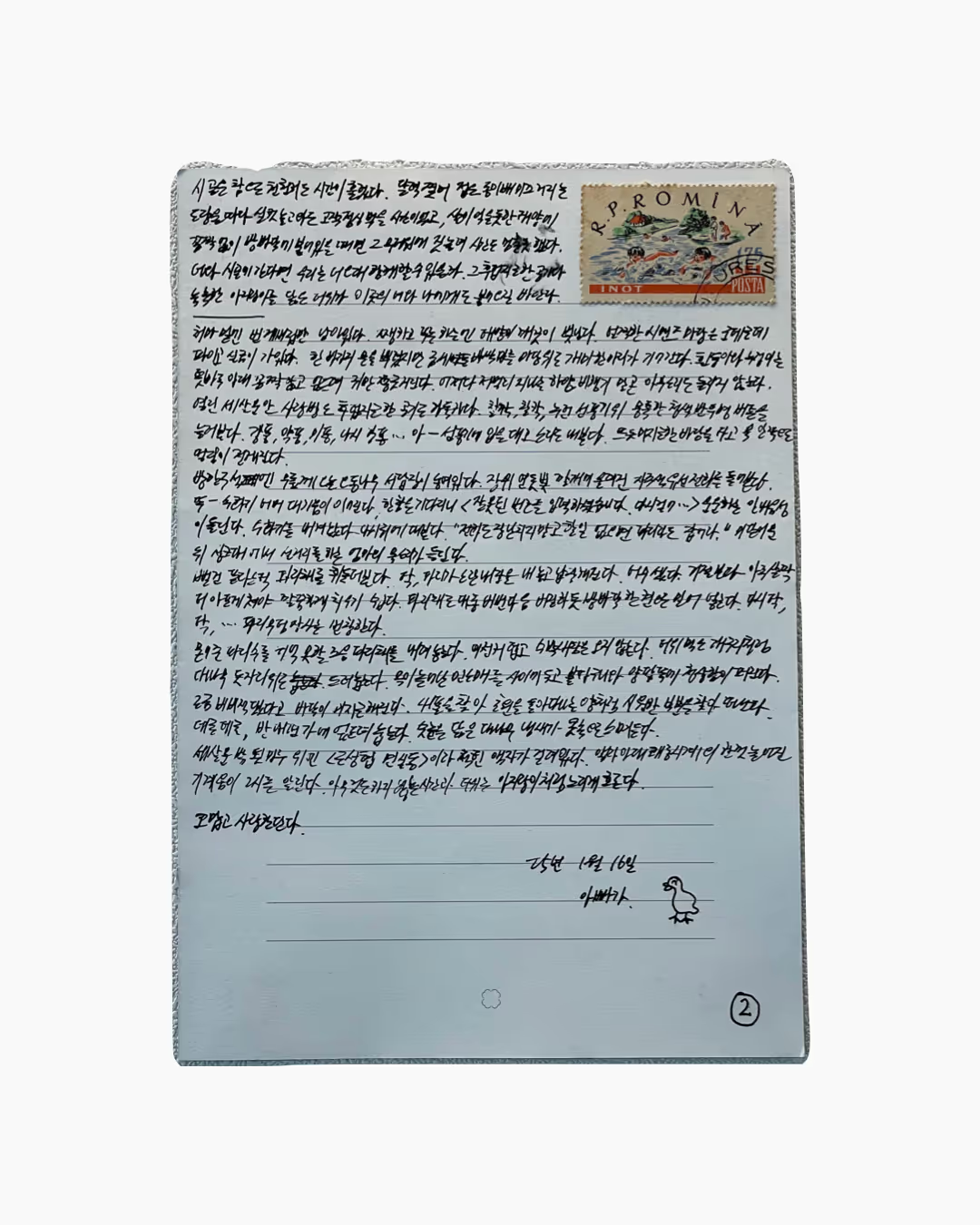96년을 추억하며
22년생 아들에게 2
사랑하는 해든,
일요일 오전, 침대에 누워 안방 천장을 바라보던 내 겨드랑이 사이로 너구리 인형을 안은 네가 가만히 들어와 눕는다. 방 안에는 정온이 가득하다. 볼록한 너의 배가 달싹이고, 햇살처럼 부푼 너의 볼 위로 솜털이 아른거린다. 꽤나 커버렸지만 여전히 조그만 너의 생을 쓰다듬어 본다. 고깔모자를 쓴 공룡들이 굴러다니는 민트색 내복 위로 소복이 솟은 주먹밥 같은 너의 날개뼈를 만져도 보고, 살며시 너의 머리에 코를 대고 가볍게 숨도 들이쉬어 본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댄 입술 위로 온갖 따스함이 묻는다.
시간은 금방 가버릴 것이다. 내가 내 아빠에게 그러했듯, 너도 곧 내 품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러하지 못했듯, 이렇게 서로의 체온으로 숨 쉬며 다붓이 누워있는 일은 오랫동안 없을 것이다. 나른한 슬픔이 물든다. 학자들은 떨어짐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말한다. 다만 때때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서로의 품에 누워 등을 어루만져보기도 하고, 캐모마일 비누를 닮은 발을 쥐어보기도 하며, 너를 손끝에 담는 일이 어색하지 않게, 지금과 같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스스럼없이 내 품에 들어와 주는 너의 고마움을 쓴다. <스킨십>, 살을 맞댄다는 건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던가.
긴긴밤을 지나 낮은 길어질 일만을 남겨두고 있다. 따스함을 한 아름 담은 햇살을 따라 너의 세 번째 생일이 올 테고, 하얀 새싹과 초록 꽃봉오리는 너의 생일을 축하하며 돋아날 것이다. 그렇게 편지 몇 통을 쓰면 태양은 북회귀선 위를 지날 것이다. 너는 또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올해 여름까지만이라도 네가 내 품에 머무를 수 있다면 좋으련만. 시간이 천천히 흐르기를, 깜빡하고 냉장고에 넣어버린 꿀처럼 느리게 흘러내리기를, 조금 더 너와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싶다.
시골은 참으로 천천히도 시간이 흘렀다. 달력 찢어 접은 종이배 미끄러지는 도랑을 따라 실컷 놀고 와도 고작 점심 먹을 시간이었고, 살이 익을 듯한 태양에 꼼짝없이 방바닥에 붙어있을 때면 그 무더위에 짓눌려 시간도 멈춘 듯했다. 너와 시골에 간다면 우리는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후덥지근한 공기와 눅눅한 아지랑이를 닮은 더위가 이곳의 너와 나에게도 불어오길 바란다.
처마 밑엔 빈 제비집만 남아 있다. 쨍하고 푸른 하늘엔 태양이 깨끗이 빛난다. 널찍한 시멘트 마당은 군데군데 파이고 실금이 가 있다. 한 바가지 물을 뿌렸지만 금세 바싹 마른 마당 위로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간다. 흰둥이와 누렁이는 툇마루 아래 꼼짝 않고 엎드려 귀만 쫑긋거린다. 어쩌다 저 멀리 지나는 하얀 비행기 말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열린 세살문 안 사랑방은 후덥지근한 공기로 가득하다. 찰칵, 찰칵, 누런 선풍기 위 뭉툭한 청색 반투명 버튼을 눌러본다. 강풍, 약풍, 미풍, 다시 강풍, ... 아— 선풍기에 입을 대고 소리도 내본다. 뜨뜻미지근한 바람을 타고 목 안쪽으로 떨림이 전해진다.
방 한 구석엔 무릎께 오는 오동나무 서랍장이 놓여있다. 장 위 연둣빛 깔개에 올려진 자주색 유선 전화를 들어본다. 뚜— 수화기 너머 대기음이 이어진다. 한참을 기다리니 <잘못된 번호를 입력하셨습니다. 다시 걸어 ...> 운운하는 안내 음성이 들린다. 수화기를 내려놨다 다시 귀에 대본다. "전화로 장난치지 말고 할 일 없으면 파리라도 잡어라." 미닫이문 뒤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뻘건 플라스틱 파리채를 휘둘러본다. 탁, 파리가 노란 내장을 내놓고 납작해진다. 너무 셌다. 기절보다 아주 살짝 더 아프게 쳐야 깔끔하게 치우기 쉽다. 파리채로 대충 비빈 다음 비질하듯 방바닥 한 켠으로 밀어 넣는다. 다시 탁, 탁, ... 파리 무덤 장사는 번창한다.
묻어준 파리 수를 기억 못 할 즈음 파리채를 내려놓는다. 여전히 덥고 수박 새참은 오지 않는다. 더위 먹은 개구리처럼 대나무 돗자리 위로 드러눕는다. 목이 늘어난 민소매를 사이에 두고 볼따구니와 양 팔뚝에 청상함이 퍼진다. 조금 비비적댔다고 바닥이 미지근해진다. 새 풀을 찾아 초원을 돌아다니는 양처럼 시원한 부분을 찾아 떠난다. 데굴데굴, 반대편 가에 엎드려 눕는다. 숫눈을 닮은 대나무 냄새가 콧속으로 스며든다.
세살문 밖 툇마루 위엔 <근성협 면실동>이라 적힌 액자가 걸려있다. 액자 아래 괘종시계의 한껏 늘어진 기계음이 2시를 알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과 더위는 아지랑이처럼 느리게 흐른다.
고맙고 사랑한단다.
25년 1월 16일
아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