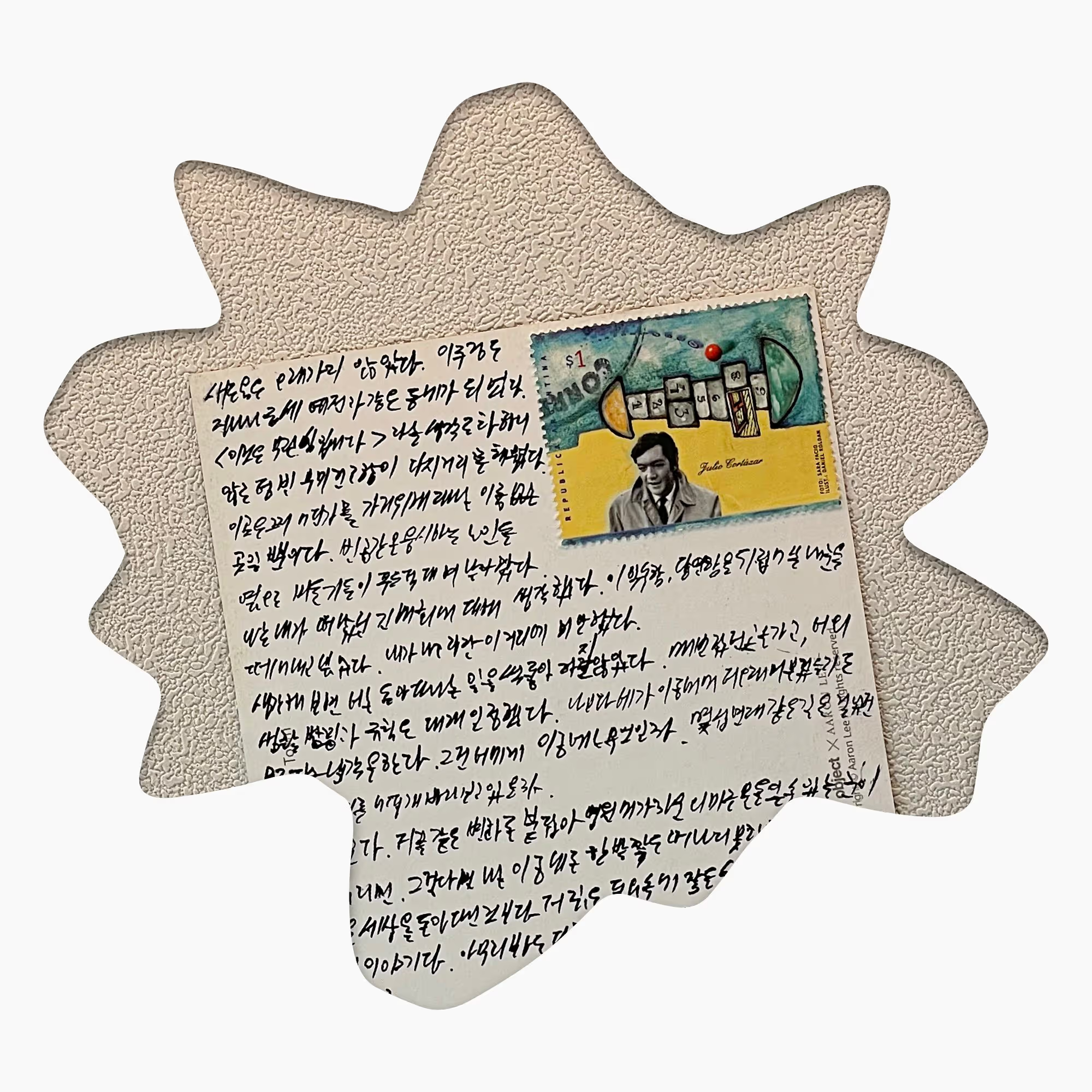
나보다 더 오래 이 동네에
머물렀을 나의 동생에게
하나뿐인 사랑하는 동생에게
숙현이가 아침에 사진을 보냈다. 아파트 화단에 꽃 핀 것 좀 보라며, 텁텁하니 불그스름한 애기동백이었다. 이곳은 여전히 앙상한 은행나무 가지들만 늘어서 있다. 봄이 올 듯 오지 않는다. 네게 편지를 쓰려 정처 없이 길을 걷고 있다. 걷다 보면 헝클어진 생각도 조금은 녹아 내리지 않을까 싶다. 네게 하고 싶은 말도 분명해졌으면 좋겠다.
새벽녘에는 오랜만에 비가 왔다. 많이 내리진 않았는지 회색 바닥이 조금 진해졌을 뿐 웅덩이가 고이진 않았다. 빗방울은 그친 것이 더 이상 오진 않으려나 보다.
철길 옆 차음 벽을 따라 걸었다. 고가도 넘어 보았다. 집에서 퍽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래봐야 몇 번이나 왔던 곳이니, 익숙한 곳이다.
너나 나나 이곳에서 태어나 몇십 년째 살고 있다. 너도 느꼈는지 모르겠다. 태어난 곳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정확히는 <점점 더 흔해지지 않을 것이다>가 맞을 테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으니. 고등학교 때만 해도 다 여기 사는 녀석들이었지만, 어디론가 하나둘 떠났다. 너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남은 친구가 없다.
한곳에 오래 사는 일에 대해 네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동네를 걷다 보면 종종 생각하게 된다. 눈을 감고도 온 거리를 그릴 수 있는 일, 이 미지근한 곤죽 같은 익숙함에 대해 말이다. 사거리는 곧 좌회전 신호가 켜질 것이다. 그다음에는 네 군데 보행자 신호가 동시에 초록불로 바뀔 것이다. 이발소 앞 깨진 보도블록의 문양은 오늘도 똑같다. 거리는 새로울 게 없다. 눈동자 위 겹겹이 덧발린 도시의 기억은 무겁다.
머리로는 알고 있다. 같다고 생각하는 건 나일 뿐, 거리는 단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다. 너는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 동네가 낯설었으면 좋겠다.
아마 십몇 년 전쯤이었을 것이다. 이 동네가 내게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 건. 너는 그때의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매일 같이 밤거리를 쏘다니거나, 말도 없이 외국으로 나가버리거나. 너와 나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았으니 내가 하는 것들에 딱히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 당시 내 유일한 일과는 밤을 기다리는 일이었다. 밤이 오면 나는 자전거를 빌려 길의 그림자 속에 스며들었다. 어두컴컴한 불빛을 틈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건물이며 담벼락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게 좋았다. 저 멀리 보이는 건물 뒤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두려움은 기분 좋은 감각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나는 그것에 몸을 맡긴 채 삐그덕거리며 밤을 기어다녔다.
중국어 간판은 시퍼렇거나, 노오란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고작 한 명이나 지날 법한 비좁은 골목길에는 주황색 가로등 하나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교회는 불이 모두 꺼져 있었고 나는 멀뚱히 계단에 앉아 있었다. 이따금 벌건 후미등이 바스락대며 멀어졌다. 모두 떠난 거리의 흔적 속에서 마주칠 일 없는 누군가의 생을 떠올리는 일이 좋았다.
먼 타국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엎어 놓은 화투패를 까듯 뒤에, 그 뒤에, 그다음을 보려 끝없이 길을 걸었다. 반질거리는 모스크 대리석 바닥에는 희미한 맨발 자국들이 찍혀있었다. 오 층 짜리 기숙사를 가득 채운 베란다에는 한 군데도 빠짐없이 색색의 빨래가 널려있었다. 인적없는 길가에 세워진 차들 사이로 앞치마를 맨 남자가 식당 뒷문 계단에 앉아 입담배를 씹고 있었다. 보잘것없이 창백하다는 푸른 점 속 쏟아져 내리는 그 삶들에 나는 압도되었다.
구슬이 깔때기 정중앙을 향하듯 나는 내가 떠났던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얼마간 바뀐 것을 찾는 일은 재미있었다. 우리 아파트는 촌스러운 파스텔 톤 분홍 페인트를 뒤집어썼다. 그물이 찢어져 림만 남은 농구대가 서 있던 집 옆 공터는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된 주차장이 되었다. 떡볶이집은 결국 한 번도 못 가보고 인형뽑기 가게로 바뀌었다. 두껍게 먼지가 쌓인 서랍장을 한 번 털어낸 것처럼 거리엔 신선함이 묻어있었다.
새로움은 오래 가지 않았다. 이 주 정도 지나니 금세 예전과 같은 동네가 되었다. <이것은 무관심입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텅 빈 무미건조함이 다시 거리를 채웠다. 이곳은 그저 어딘가를 가기 위해 지나는 이름 없는 곳일 뿐이다. 빈 공간을 응시하는 노인들 옆으로 비둘기들이 푸드덕대며 날아갔다. 나는 내가 떠났던 긴 배회에 대해 생각했다. 이 익숙함, 당연함을 뒤집어쓴 내 눈을 떼어내고 싶었다. 내가 나고 자란 이 거리에 미안했다.
생각해 보면 너는 돌아다니는 일을 썩 좋아하지 않았다. 매번 갔던 곳을 가고, 너의 생활 반경과 규칙은 대개 일정했다. 나보다 네가 이 동네에 더 오래 머물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너에게 이 동네는 무엇일까. 몇십 년째 같은 길을 걸었던 너는 이 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나는 꿈꾼다. 티끌 같은 변화를 붙잡아 영원에 가까운 의미로 물들일 수 있는 눈이 나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동네를 한 발짝도 떠나지 못한 채 땅에 묻힌다 한들, 온 세상을 돌아다닌 것보다 더 깊은 풍요 속에서 잠들 수 있을 텐데. 퍽 이상적인 이야기다. 아무리 봐도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이 거리 그 어디서 새로움을 만들어 낼 것인가?
그 배회 이후 십몇 년이 흘렀다. 변한 건 크게 없다.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어김없이 아파트 화단에 핀 하얀 목련을 보다가, 문득 떠올린다. 낯설게 봐야 하는데. 억지로 건물 뒤도 지워보고 사팔뜨기처럼 눈도 떠본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건 내가 자란 동네가 아니다, 어느 이름 모를 도시다… 감각은 금세 사라진다. 아직도 내 눈은 진부함에 짓눌려있다.
한동안 잊혀가던 생각을 꺼내게 해줘 고맙다. 어렵지만 나는 계속해서 이곳을 어제와 다른 곳으로 보려 할 것이다. 퍽 이상적이진 못하겠지만, 익숙함 속에 파묻혀가는 이곳을 어떻게든 끌어내 볼 것이다. 너의 조언은 언제든지 환영이다. 아무래도 네가 이 동네는 더 오래 바라봤을 듯하니.
그렇게 한참 동네를 걸었다. 길의 끝 아우성쳐 흘러가는 인파 속에 들어와 네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 멀리 떨어져 있진 아니하나, 건강하길 바란다.
p.s. 편지를 쓴 지 며칠 만에 날이 개고 회양목이 푸릇해졌다. 낯설게 보기 쉬워질지도 모르겠다.
p.s. 2 사람살이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늘 옆에 있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생각했건만, 어느 날 문득 바라보니 옛날 그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그 무상함과 텅 비어버린 시간을 대하는 일을. 진부함과 당연함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일을 말이다. 너도 언젠가 이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한다. 누군가를 뭉텅이로 잃지 않는 일에 대해.
25년 3월 27일
너의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