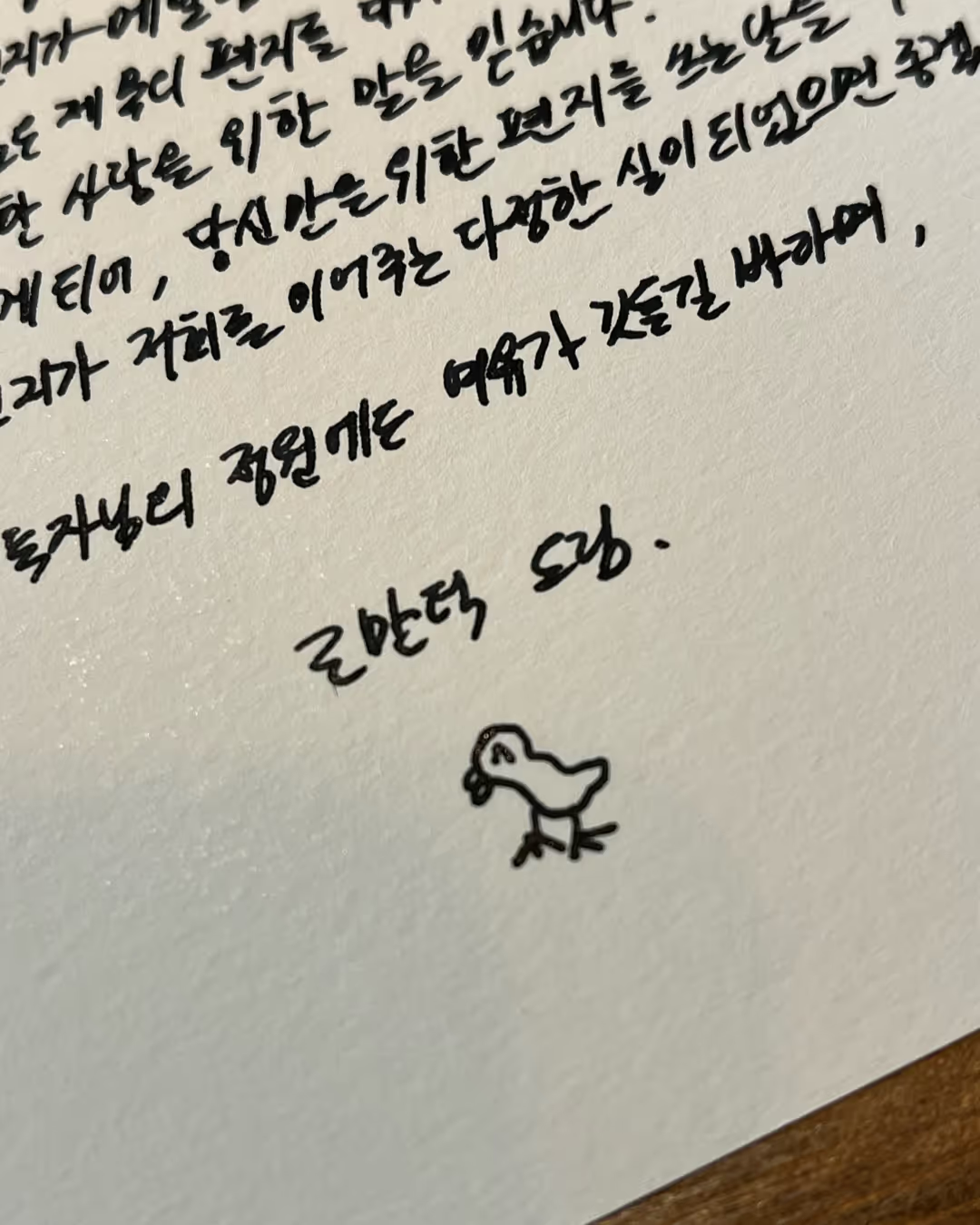따듯한 환대
이름 모를 구독자님께,
어쩌면 잠깐의 호기심에 이곳에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회전초 같은 편지들이 구독자님의 마음에 들었을지도요. 이유야 어떻든, 이렇게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만덕입니다.
저는 <로레터>라는 작은 편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는 물건은 없지만, 기분이라도 내볼 겸 회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편지 쓰기입니다. 마음은 이따시만한데, 종이에 옮기기만 하면 형편없어진다는 게 문제지만요.
두 해 전, 첫 편지를 썼습니다. 너를 떠올리는 정원 위로 하롱하롱 떨어지는 햇살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해든이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통만 쓰면 정 없으니까 한 통 더 쓰고, 형한테만 썼다고 섭섭해할지도 모르니까 해랑이에게도 쓰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내인데 안 쓸 수 없으니 다시 노트북을 켜고…
밍밍하게 식어버린 커피가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생각했지만, 쓴다는 건 고난이더군요. 마음은 이미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 중인데, 검은 화면에 쏟아지는 거라곤 인스타그램 협찬 후기에서나 보일 법한 문장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쓸 수도, 버릴 수도 없게 된 문장들이 그리움의 밀푀유를 만들 즈음,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 단 하나뿐인 말로 그를 사랑하는 일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봤다고 이 편지가 구독자님을 향한 사랑의 프러포즈는 될 수 없겠습니다만, 산더미처럼 쌓인 문장들을 보고 있자니 썸 정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혼자 타는 썸 말이죠.
삐까뻔쩍한 브랜드들처럼 일요일마다 찾아뵙겠다느니, 절대 놓치면 안 될 할인 정보 같은 건 아무래도 힘들 듯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 편지가 메일함 맨 아래서 먼지를 뒤집어쓸 즈음 “내가 이런 것도 구독했었나” 싶은 제목의 편지를 다시 보내드리는 것뿐이겠죠.
단 한 사람을 위한 말을 믿습니다. 언젠가 구독자님을 알게 되어, 당신만을 위한 편지를 쓰는 날을 떠올립니다. 그때까지, 이 가느다란 편지가 저희를 이어주는 다정한 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의 정원에도 여유가 깃들길 바라며,
로만덕 드림.